소설 ‘은교’에는 ‘심장’이라는 제목의 단편이 등장한다. 표제만 등장할 뿐이지만 영화 ‘비터문’을 조금 변형하여 썼을 뿐이라는 묘사가 나온다. 소설 속 소설의 직접 내용이야 언급되지 않지만 어떤 내용인지 짐작이 간다. 물론 장르가 옮겨가고, 배경이나 등장인물이 윤색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들은 분명 창작이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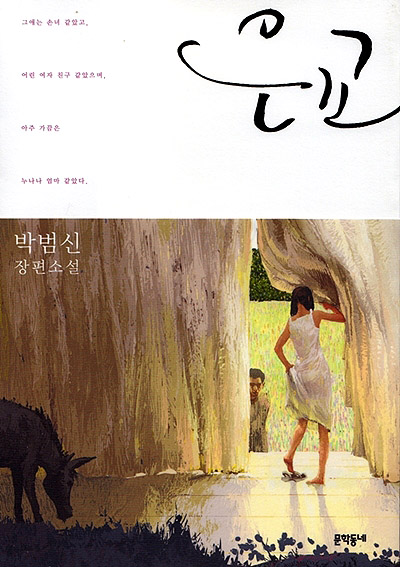
‘은교’를 읽으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다. 바로 루이 말 감독, 줄리엣 비노쉬 주연의 ‘데미지’다. 스티븐 플레밍(제레미 아이언스)에 이적요 시인을, 안나(줄리엣 비노쉬)에 은교를, 마틴 플레밍(제레미 아이언스 아들 역)에 소설가 서지우를 끼워 넣으면 얼추 구도가 다 맞아 떨어진다.
이적요 시인과 서지우는 생물학적 부자관계가 아닐 뿐 그 애증관계는 더 이상 끈끈할 수 없는 부자지간의 것이며, 극 속에서 스티븐 플레밍(제레미아이언스)이 사회적 저명인사였다는 것, 아들인 마틴 플레밍은 비교적 성공한 인생이기는 했지만 동일 분야에서의 아버지의 업적이나 명성과 비교할 수는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 안나에게 어필할 때 마틴 플레밍보다는 스티븐 플레밍이 훨씬 열정적이고, 더 맹목적이고 그러면서 더욱 노련했다는 점은 ‘은교’와 딱딱 맞아 떨어진다. ‘사회적 명성을 다 가진 노년의 신사가 열정의 무게 때문에 버거워하는 모습’이라는 소재 자체도 비슷하고 말이다.
거기서 살짝 -실제로 살짝이 아니지만, ‘은교’에서 ‘심장’이라는 소설이 ‘비터문’을 “살짝”비틀었다고 하니까 쓰는 말이다 – 비튼 것이 안나와 달리 은교는 약혼녀가 아닌 17세 소녀고, 은교와 서지우의 관계가 실제 연인이라기 보다는 원조교제 사이라는 것, 이적요 시인이 정치인이 아닌 시인이라는 점, 한국의 북한산 언저리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

이 외에도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가림 글 설정 합니다)
more..
영화는 카메라의 시점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소설은 ‘화자’의 입을 빌어 서술된다는 차이점으로 인한 장르적 특성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은교에서의 이적요 시인이나, 서지우 소설가의 심리묘사는 지나친 감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다.
한번도 결혼한 적이 없다는 것, 조용히 살아왔다는 것, 10년간의 수감생활 이후 시를 쓰며 마치 수도승 처럼 살아왔다는 것,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 등 ‘노인네가 감당할 수 없는 욕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당화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말이다. 67~69세 정도의 노인(사실 노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나이다)이 감당할 수 없는 열정을 가지게 되는 일은 구구절절한 정당화가 없어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말이다.
스티븐 플레밍(제레미 아이언스)의 열정과 욕망에는 별 다른 이유가 붙지 않는다. ‘은교’초입에 나오는 문장처럼 ‘사람이란 본디 미친 감정’이 아니겠는가. 뭐 문단 서두에 써 두긴 했지만 그 구구절절한 묘사가 이 작품의 미덕이고 가치인지도 모르겠다.
서지우의 은교에 대한 사랑역시 구구절절한 핑계를 동반한다. 서지우의 ‘은교’에 대한 사랑은 마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인 듯 하다. 서지우가 본디 은교를 사랑하였는가. ‘은교’에 대해 별 생각이 없던 서지우는 이적요가 은교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점부터 맹렬하게 변화한다. 아버지의 여자인 엄마를 사랑하는 오이디푸스와 같이.
그 심리가 붕 뜨는 것은 역시 ‘은교’다. 소설의 표제는 ‘은교’지만 사실 주체로써의 ‘은교’의 얘기는 어디에도 없다. 은교는 생각없고 철없는 요즘 고등학생이건, 혹은 주체할 수 없는 생명력의 이음동의어로써의 여신이건 객체에 머물러있다. 몇 마디 스스로 입을 열어 말을 하긴 하고, 일정 부분 수긍도 되지만 그 말은 서지우나 이적요의 자기 고백처럼 완성성을 지니지 않는다.
데미지에서의 ‘안나’는 ‘사회적 명성을 다 가진 노년의 신사가 열정의 무게 때문에 버거워하는 모습’을 그리기에 지나치게 설명되는 감이 없지 않다. 내가 볼 때 ‘데미지’의 안나는 그저 자신이 가진 욕망에 충실하고 그것을 잘 조정하고 저글링하는 영악한 여자일 뿐, 어릴 때 아버지 직업 때문에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느니 친오빠가 방문 앞에서 자살했느니 하는 트라우마는 그저 구절구절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스티븐 플레밍의 자기 파괴적 열정과, 아들인 마틴 플레밍의 절망감에 대한 묘사는 그렇게 간단히 잘라버리면서, 두 남자 사이를 오가는 ‘안나’의 행동에 핑계를 대주는 데 그렇게 골몰했던 게 루이 말 감독의 ‘데미지’다. 그 점이 바로 ‘은교’와 ‘데미지’가 확연히 다른 지점이기도 할테다.
삶을 뒤흔드는 열정의 존재가 뭐가 그리 새삼스럽겠는가. 어떤 시점의, 어떤 상황 속의 열정은 사람의 삶을 사회적 성공과 표준적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지만, 어떤 시점, 어떤 상황 속의 열정은 삶을 파괴하는 힘이 되기도 하는 것이라는 것이. 생물학적 나이와 무슨 상관이겠으며, 개인이 놓인 상황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영진공 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