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작가의 책을 계속 읽다보면 지겨워질 때가 있다. 예컨대 나랑 동갑에다 미모며 별 거 아닌 스토리로 책 한권을 만드는 재주가 있는 아멜리 노통은 열권 가까이 읽었더니 이젠 이름만 들어도 멀미가 난다. 한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라고 떠들고 다녔던 베르베르와는 <뇌>를 끝으로 결별했다. 이와 반대로 읽을수록 저자에게 빠져들고, 다음 책을 빨리 내줬으면, 하는 작가들이 있는데, 미야베 미유키가 바로 그런 작가다. 특히 <이유>라는 작품은 결정적으로 미미여사를 존경하게 만든 작품. 그 후부터 미미여사가 쓰면 난 산다,는 단순한 원칙을 실천하며 살고 있다.
<스나크 사냥>을 읽은 건 대략 한 달쯤 전이다. ‘스나크’가 뭔지도 모르면서 책을 산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내 원칙 때문인데, 알고보니 스나크는 루이스 캐롤이 창안한 괴물로, 그 괴물을 잡으면 잡은 사람이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린단다. 스나크가 언제쯤 나오려나 책장을 넘기다, 이야기에 빠져들어 스나크가 나오건말건 상관없다는 태도로 책을 읽은 기억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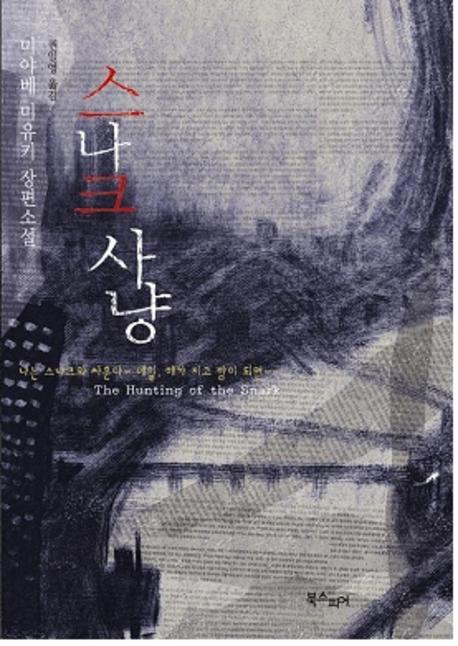
미미여사의 뛰어난 점은 스피디하게 사건을 전개함으로써 하려던 일을 작파하고 책을 읽게 만든다는 것도 있지만, 무릎을 치게 만들만큼 표현력이 출중하다는 것도 또다른 장점이다. 예컨대 남자가 여자를 이용할대로 이용하고 버렸을 때, 미미여사는 이런 표현을 썼다.
“오빠는 그녀를 완전히 버렸다. 대기권을 빠져나간 로켓이 필요 없어진 연료 탱크를 떼어 버리듯이.(49쪽)”
아류작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저 표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을 거다.
“오빠는 그녀를 버렸다. 2층에 올라간 헤밍웨이가 사다리를 치워버리듯이”
쓰고나니 괜찮은 아류작 같다는 생각이 든다. 또다른 구절을 보자.
“노리코는 입을 다물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마치 커다란 케이크를 통째로 주고 자, 마음대로 잘라라,하는 말을 들은 다섯 살 어린애같은 심정이었다(207쪽).”
한 2-3분 머리를 굴렸지만 이건 아류작도 못만들겠다.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 미미여사는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했을까?
번역자 혹은 작가의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만 더 옮겨본다. 상황은 신랑과 신부가 막 결혼을 한 상태.
“신부는..오늘 밤은 푹 자고 싶다고 했다. 할 기분이 아니야. 상관없잖아. 어차피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한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또 있어서 반가웠지만, 그보다 ‘할’과 ‘하는’ 위에다 점을 찍어 강조를 한 게 웃겼다. 대체 점은 왜 찍어놓은 걸까? 읽다보니 다른 대목에도 강조를 해놓은 게 있었지만, ‘하는’에 찍어놓은 점은 읽는 내내 웃겼다. 내가 요즘 너무 밝히는 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