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 년 전 불지옥과 같은 지구에서 생명이 탄생하게 된 이유를 밝히려는 과학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중 1929년 영국의 생물학자 J.B.S 홀데인이 발표한 원시수프(Primordial Soup) 가설은 여러 논란 속에서도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영국의 한 연구진은 원시스프 따위는 뻥이다 라며 새 이론을 발표했다.(‘원시수프’생명기원 가설 뒤집혀 http://www.sciencetimes.co.kr/article.do?atidx=0000037583) 그들은 원시스프에는 화학반응을 일으킬만한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으며 생명체를 탄생시킨 것은 해상 열수구에서 나온 지구의 화학에너지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21세기에도 생명탄생의 이유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과거에 폐기처분 되었던 한 이론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원시스프 이론이 등장하기 전인 1901년 스웨덴의 화학자 스반테 아레니우스는 판스페르미아(Panspermia)이론이라는 흥미로운 가설을 발표 했다.

1903년 노벨화학상을 받았으며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간다는 온실효과를 처음 발견했던 아레니우스는 생명은 지구에서 뾰로롱~하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주로부터 박테리아 포자가 날아온 것이라는 외계 기원설을 주장했다.
물론 이 주장은 씨도 안먹혔다. 혹독한 우주공간을 견디고 살아남아서 지구로 날아와 생명의 꽃을 피운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우주 부럽지 않은 지구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잘먹고 잘살고 있는 생물들이 속속 발견되면서 판스페르미아 이론은 재조명을 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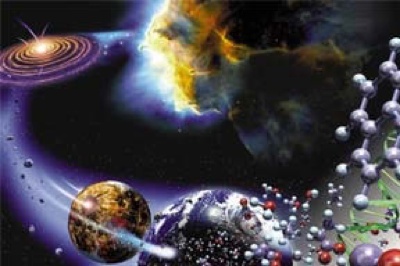
지구상의 생물을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생명체는 극단적인 환경에선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그것은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인데 바로 단백질과 세포때문이다.
생물의 몸은 주로 단백질로 되어 있다. 근육에서부터 소화 효소에 이르기 까지 모두 단백질이다. 근데 요 단백질이란 놈은 쉽게 변형이 되고 변형이 되면 본래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변형이 되면 원래의 형태로 되돌아가질 못한다. 찐계란을 가지고 별 짓을 다해보아도 다시 날계란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또한 세포는 세포막이 문제다. 이 세포막이 부서지면 세포 자체가 부서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바꿔 생각해보자. 만약 단백질이나 세포막이 부서지지 않으면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아프리카의 반건조 지대에는 아프리카깔따구(Polypedilum vanderplanki)라는 물지 않는 모기의 일종이 살고 있다. 아프리카깔따구의 수명은 약 1개월인데, 그 대부분을 애벌레로 지낸다. 애벌레의 몸길이는 1cm미만인데, 이 애벌레는 최장 8개월이나 계속되는 극도의 건조 상태에서도 견디는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살고 있던 웅덩이가 말라 버리면 애벌레의 몸은 절반으로 꺾이고 바싹 마른다. 일반적으로 애벌레의 몸에는 80%가량의 수분이 포함되는데, 건조해지면 겨우 몇%까지 줄어든다. 하지만 죽지는 않고, 비가 와서 수분이 공급되면, 한 시간이면 원상태로 살아난다.
아프리카깔따구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건조함을 견딜 수 있을까? 그것은 사라진 수분 대신에 몸속을 ‘트레할로오스(trehalose)라는 당으로 메워서, 세포가 부서지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트레할로오스는 유리상태라는 액체와 고체의 중간과 같은 상태가 되어, 세포를 단단하게 만든다. 수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세포나 세포 안의 소기관의 형태는 쭈글쭈글하게 되지만 단백질이나 세포막을 단단히 보호하게 된다. 물을 흡수해 살아날 때는 건조할 때와 반대의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몇 번이고 건조함을 견딜 수 있는 것이다.

자연계에 흔히 존재하며 특히 사막에 사는 선인장에서 많이 존재하는 물질이다.
보습제로도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깔따구가 트레할로오스만으로 건조함을 견디는 것은 아니다. ‘LEA(레아)단백질’이라는 특수한 단백질이 건조할 때 세포 내의 단백질끼리 붙는 것을 막거나, 건조할 때 상처를 입은 유전자를 살아난 후에 복구하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져 있다.
그리고 건조된 아프리카깔따구의 애벌레는 생명활동(대사)도 전혀 하지 않는다. 대사를 낮게 억제하는 곰이나 다람쥐의 동면과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이다. 이처럼 대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건조함 등에 견디는 능력을 ‘크립토바이오시스(cryptobiosis)’라고 불린다.

윤형동물인 담륜충rotifer(좌) 와 완보동물(몸길이 0.5~1mm의 매우 작은 동물군)의
하나인 물곰water bear(우) 이 있다.
이들 생물도 크립토바이오시스에 트레할로오스를 이용한다.
아프리카깔따구의 애벌레가 가진 능력은 건조함에 견디는 것만이 아니다. 건조 상태에 빠진 애벌레는 100도의 고온에서 몇 시간 그리고 -270도라는 극도의 저온에 3일 이상 놓여도 살아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더욱이 에탄올 속에 1주일 동안 잠겨 있어도, 7000Gy의 방사선을 쬐어도 죽지 않는다. 또 건조 상태에서 17년간 보관되어 있던 애벌레가 살아났다는 기록까지 있다.
이런 아프리카깔따구의 능력에 주목한 과학자들은 우주에서도 시험해 보았다. 2007년 6월 국제 우주 정거장의 바깥쪽, 즉 우주 공간에 아프리카깔따구의 건조 애벌레를 방치하였다가 약 1년 후에 회수하여 지구로 귀환했다. 애벌레는 금속제 용기 안에서 플라스틱 샬레에 나뉘어 들어 있었는데, 태양빛의 고열에 의해 샬레는 녹아서 변형되었지만 애벌레는 물을 주자 원상태로 살아났다.
이 놀라운 능력 때문에 아프리카깔따구의 건조 애벌레는 2011년에 발사 예정인 러시아의 탐사선 포보스 그룬트 (Phobos Grunt)에 몇몇 미생물과 함께 탑재될 예정이다. 이 탐사선은 화성의 위성 포보스에서 샘플을 채취해 지구에 돌아옴과 동시에, 화성으로의 기나긴 왕복여행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왕복에 필요한 기간은 약 3년, 인류에 앞서 화성을 왕복하는 아프리카깔따구는 그 여정에서 생명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2009년 발사 예정이었지만 2011년으로 늦춰지게 되었다
이 밖에도 강한 산성 환경이나 수천 미터의 심해, 해저열수구 등 극한 환경에서 사는 생물들이 발견되면서 과학자들은 초기의 생명들이 우주 어딘가에서 날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으며 반대로 지구의 생명이 다른 행성으로 건너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바보같은 소리로 치부되었던 판스페르미아 이론이 한세기가 지난 지금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이다.
현재 과학자들은 미생물이 우주를 이동할 가능성을 검증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그 계획은 씨앗을 바람에 날려 보내는 민들레를 본떠 ‘민들레 계획’이라고 명명했다. 에어로젤aerogel이라는 극히 저밀도의 소재로 된 쿠션을 국제 우주 정거장에 붙여서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는 먼지를 포착해, 생물의 흔적이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현제 계획대로 진행되면 에어로젤은 2012년 일본의 무인 보급선으로 우주 정거장으로 운반될 예정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고체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과연 지구 생명체의 기원은 외계 저 멀리에서 날아온 생명체일까? 생명체가 전혀 살 수 없는 불모의 공간으로 여겨졌던 우주가 사실은 생명의 씨앗으로 가득찬 공간이었던 것일까. 민들레 계획으로 과연 지구 생명체의 기원과 함께 우주의 또다른 얼굴을 보여줄 수 있을지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자.
*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