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내에 수입되는 중국 영화들을 보면 – 좀 더 정확히는 중국 영화들에 대한 국내 관객들의 반응을 보면 상당한 격세지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 감상의 요점이란 결국 중국 영화에 대한 우리나라 관객들의 관심이 예전만 못하다는 건데요, 홍콩의 영화 제작 기술과 배우, 스텝들이 중국 본토의 막대한 영화 시장과 자본, 정부 지원 정책 등과 만나 상당히 수준 높은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기는 좀처럼 다시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감독의 <영웅>(2002) 을 기점으로 본격화된 컨텐츠의 천편일률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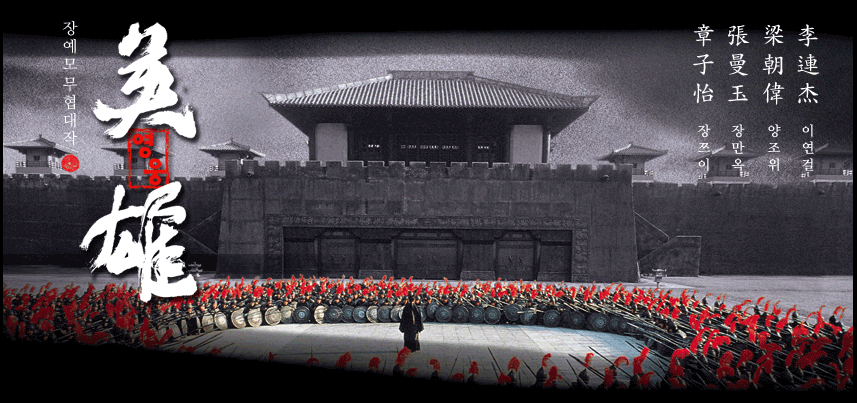
중국 정부의 정책적 방향 때문인지 아니면 현시점에 중국 내수 영화 시장에서 요구하는 컨텐츠의 특성 때문인지는 좀 더 면밀한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 결국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와 같은 것일 수도 있겠네요 –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제작되어 국내에 수입된 중국 블럭버스터들이 하나 같이 ‘전체/대의를 위해 희생하는 개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스펙타클을 펼쳐 보인다 하더라도 매번 선보이는 작품들마다 그 나물에 그 밥인 엇비슷한 내용과 주제만을 강조하니 식상하다는 반응을 얻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영화의 문화 산업적인 특성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80년대에 홍콩은 우리나라 관객들에게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선진화된 국가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홍콩에서 물 건너 온 것은 어찌되었거나 좋은 것들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90년대를 거쳐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음악이, 그리고 영화에 있어서 국산품이 수입품을 누르고 내수 시장을 점령하는 시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홍콩은 중국에 반환이 되면서 영화 산업계의 지각 변동을 맞았지요. 이제 홍콩과 중국 영화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상황에서 국내에 소개되는 영화들은 더이상 선진 문물로서의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역으로 중국 영화들은 분명히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지금의 헐리웃 영화가 국내 시장에서 갖는 지위를 차지하게 되리라는 것을 예상해볼 수도 있게 됩니다.

중국 본토의 관객들이 선호할 만한 소재를 찾아내고 그들의 대중적인 감성과 집단 의식을 자극하려는 전략은 <8인 : 최후의 결사단>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20세기 초 청나라 말기, 영국령이 되어버린 홍콩을 배경으로 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 훗날 신해혁명으로 불리게 된 1911년 손문의 홍콩 방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 몽고족에 의한 오랜 지배와 부패, 외세에 대한 무기력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한족들의 ‘거룩한’ 희생을 다룬 작품이라 하겠습니다.
한족 중국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역사가 바로 칭기스칸에 의해 중국 대륙이 몽고족에게 지배를 받았다는 사실인 관계로 칭기스칸과 청나라에 대한 해석이 미국과 중국에 의해 서로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생각하면 상당히 흥미로운 시점을 다룬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청나라 황실은 혁명지도자인 손문을 암살하려고 하고 홍콩의 혁명가들은 손문을 지키려고 합니다. <8인 : 최후의 결사단>은 손문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무사히 홍콩을 다녀가기까지 암살자들의 위협을 죽음으로써 막아낸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전반부에서 이들 인물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배치한 이후 후반부 기다리던 손문의 홍콩 도착과 함께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아날로그 액션을 전개하며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8인 : 최후의 결사단>은 영화 만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한 마디로 더이상 손 댈 구석이 없을 만큼 세련되면서도 거의 완벽한 만듦새를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년 전 홍콩 영화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배우들 – 장학우, 양가휘, 증지위, 임달화에서부터 비교적 최근의 여명, 견자단, 사정봉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튀는 이 없이 하나의 작품 안에 완벽하게 녹아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액션이면 액션, 드라마면 드라마, 그외 미장셴과 배경음악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외양을 갖추었음에도 관객으로서 영화 속으로 흠뻑 빠져들지 못하고 마는 이유는 결국 그 속내가 뻔히 들여다보이는 전개 방식과 천편일률적으로 반복되는 주제 의식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중적인 블럭버스터 영화가 갖는 한계는 비단 중국 영화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금 중국의 블럭버스터들은 온통 자기 자신들에게만 신경을 집중시키느라 주변을 전혀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느낌을 주곤 합니다. 같은 중국계 영화라 하더라도 이안 감독의 작품들, <와호장룡>(2000)이나 <색, 계>(2007)가 중국인이 아닌 외국 관객들에게까지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들을 생각해보면 최근 몇 년과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되리라 예상되는 중국 영화들의 한계 –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도통 재미가 없는 – 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중국 영화가 과거 한국 내 시장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영광의 나날을 되찾을 수 있으려면 국내 관객들이 중화풍의 것들에 대한 선망의 시선을 갖게 되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거나, 아니면 중국 영화가 지금보다 스타일이나 내용 면에서 좀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는 중국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한국영화의 해외 경쟁력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요. 제조에 강한 나라가 문화 컨텐츠의 강국으로 거듭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은 본래 가진 것이 많은 문화적 거대 잠룡이라고 할 수 있어 단지 시간이 문제일 뿐이겠지만 우리나라는 과연 국내외 관객들에게 보여줄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ps. 글 내용 중에 언급된 중국 역사와 관련해 지적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확인해본 결과, 원나라(칭기스칸/몽고족) -> 명나라(한족) -> 청나라(여진족/만주족)이 정확한 역사더군요. 위에 언급된 내용 가운데 칭기스칸/몽고족과 청나라를 연결해서 언급한 부분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