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FF 빌리지 오픈카페 – 도대체 아무리 국제 행사라지만 ‘한글’로 된 장소명은 없냐능 – 에서 벌어진 ‘아주담담’ – 어차피 행사명은 한글이면서 말이죠 – 중 제 관심사와는 별개로 시간이 남는 바람에 관람하게 된 것이 <한국의 여성 감독들>이란 주제의 대담이었습니다.

오픈 카페 행사치고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든 경우인데요. 아마 대부분의 PIFF 행사 관객이 ‘여성’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게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5인 감독인데 이 중 임순례 감독을 제외하곤 전부 최근 ‘잇뽕’을 한 감독들입니다. – ‘잇뽕’도いっぽん [一本] 이라는 일본어죠. 뭐 어차피 데뷔도 우리말 아니고. –
사실 진행자의 질문부터 시작해서 좀 뻔한 이야기였어요. 다들 ‘연출부’의 일을 겪었느니, 스크립터 일을 했을 때 경험이 도움됐다. 이런 식인데…. 이건 너무 상투적이잖아요. 도대체 대한민국 사회에서 ‘씨다’ 생활 안 하는 사람은 엄친아나 엄친딸 밖에 없지 않나요? – 물론 제 주위의 엄친아들은 다들 씨다 생활 합니다 ㅡ.ㅡ –
관객들이 그나마 궁금할 수 있던 ‘여자라서 힘든 점’을 묻는 이 뻔한 레퍼토리는 한숨이 절로 나오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 나라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힘들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사실 제가 ‘여성 감독’의 입장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아요.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미국 드라마 <ER>의 감독 ‘미미 레더’가 <딥 임팩트>라는 영화를 감독할 때 ‘여성 감독’과 ‘남성 감독’의 시선 차이에 대해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당시에 <딥 임팩트>는 똑같이 혜성이 지구에 충돌한다는 소재로 ‘제리 브룩하이머’ 제작, ‘마이클 베이’ 감독의 <아마겟돈>과 비슷한 시기에 개봉이 되어버렸어요. 결론은 <아마겟돈>의 승리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저는 <딥 임팩트>가 훨씬 섬세하고 디테일이 살아 있는 감동으로 다가왔다는 점이에요.
더군다나 <딥 임팩트> 이전에, ‘미미 레더’가 감독했던 <피스 메이커>는 액션 영화의 감각 또한 ‘여성 감독의 시선’을 씌우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전 거기에서 하나 더 의문이 들었죠.
시장 논리와 비슷한 것인데, 제가 미미 레더 감독의 이런 ‘시선’을 통한 영화들에 신선한 감각을 느끼면서 즐거워할 수 있지만 과연 ‘다수 관객’들이 이 영화를 선택할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심지어 여성 관객층이 엄청나다 하더라도 흥행성을 비롯하여 영화의 선택에서 이 ‘여성’ 들이 과연 <딥 임팩트>와 <아마겟돈>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여성 감독의 영화라서 ‘여성 다수’가 공감한다는 건 억측이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무모한 주장? 또 다른 편견?
사실 PIFF 행사에서 ‘여성감독들’이란 주제로 아주담담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미 ‘여성의 시선’이라는 것이 하나의 독립적일 수 있는 인간의 관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전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남성 감독도 여성만큼 섬세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고, 여성 감독의 이야기가 남성들에게 충분히 공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퍼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간과하고 ‘아~ 여성 감독이라서…’ 라고 잣대를 댄 이야기를 충분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뭔가요?
장애우 감독이 등장해야만 장애우의 시각을 제대로 다룬 영화가 나오나요? 레즈비언 혹은 게이 감독의 영화가 등장해야 ‘제대로 된 시각’을 반영할까요?
또 다시.
결국 소통 이야기로 흘러가는 <은하해방전선> 같은 뻔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남성중심의 사회’이자 군대에 갔다 온 남자들이 사회의 주도권을 쥐면서 ‘군대의 상하 계급 문화’를 적용시킨 일종의 ‘병영국가’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회에서 ‘여성의 시각’이 새롭게 비치는 것은 그만큼 ‘볼 수 없었던 시선’이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비주류’였기 때문이죠.
영화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 할리우드 키드이자 홍콩 키드죠. 한국 액션 영화가 60년대에 어떤 영광을 누렸든 간에 – 제 기억에도 어렴풋이 남아 있는 팔도사나이나 손가락 7개? 8개만 가지고 액션을 펼쳤던 영웅도 남아있지만 결국 영웅본색과 같은 느와르나 무협영화, 강시영화 아니면 전부 할리우드 영화니까요 – 머릿속에 그동안 보아온 영화가 그런 ‘엄청난 영화들’이었으니 여성 감독들이 뱉어내는 이야기들이 ‘신선’하다고 보이는 것은 당연한 걸지도 몰라요.
하지만 뜬금없이 여성 감독들의 이야기가 튀어나온 것도 아니죠. 그들의 시각이 ‘신선’하다구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문화’관련 주 소비층은 이미 여성이 다수입니다. 20~30대의 여성층이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죠.
덕분에 여성 감독의 잇뽕도 늘었죠. 이뿐인가요? TV를 비롯해 드라마작가, 구성작가 다수가 여성이에요. 이 여성들이 내뱉어내는 이야기에 남성상이 그려지고 여성상이 그려지고 있어요. 보수적인 – 나쁜 의미의 보수가 아닌 – 남성들은 그런 TV 시스템에 숨막혀 갈 곳을 잃어가고 있지요.
아마 어떤 페미니스트가 보면 기가 찰 겁니다. 아니 아직도 이 사회의 양성 평등은 갈 길이 먼데 무슨 헛 소리냐고.
관객과의 질문대답 시간의 가장 마지막에 제가 물었던 질문의 요지는 딴 게 아니었어요. ‘여성 감독’이라는 주변 시각 때문에 영화감독으로써 이야기를 매만질 때 ‘자체 검열’을 하게 되는 경험이 있는지가 궁금했죠.
임순례 감독의 대답은 참으로 ‘당연하고도’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어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영화감독이라면 제작자의 압박이고 나발이고 ‘하고픈 이야기’를 해내야죠.
이건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이야기와도 관련이 있어요.
내가 우파인데 자신 있게 우파라고 얘기 못 하는 사람들 – 좌파도 마찬가지 -.
주변 시각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믿는 바를 꺾어가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까발려 놓고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 만드는 영화가 ‘여성 감독’의 시선으로 포장되지 않는 사회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은 ‘합리적’이려고 노력하는 동물입니다. 이때의 ‘합리’라는 것은 이익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성에 합치하려는’ 것을 말해요. 여성 감독들에게 거는 기대가 남성 중심의 시각에 얽매이지 않고 ‘합리적’인 것을 중시하는 경향이라면 그건 억지스런 주장일 수밖에 없어요. 이미 대다수의 여성 감독을 노려야 하는 여성들은 ‘남성 중심의 세상’에서 ‘씨다’를 거쳐 입뽕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물론 감독들의 말마따나 ‘영화판’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거의 없다고 믿는다손 치더라도 그들이 만들어내고 이야기 해야 하는 이 사회는 안 그렇다는 거죠. 동떨어진 이야기를 만들어낼 순 없잖아요? 그리고 임순례 감독의 그 섬세한 이야기 밀도를 보세요. 그게 ‘차별’을 안 겪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던가요?
결국 ‘깨어 있는 사람’이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감독’이 되어야 – 아니 개인적으로 이 나라에서는 ‘제작자’가 되어야 라고 쓰고 싶습니다만 – 하겠지만. 역시나 어려운 일이죠.
그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감독이라서 달라’가 아니라 사회의 차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감독. 그 감독의 성별이 여성이 되었든 남성이 되었든 결국엔 자기만의 독특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여성 감독의 영화’로 분류하면 할수록 그건 ‘우리 이야기’로 100% 동화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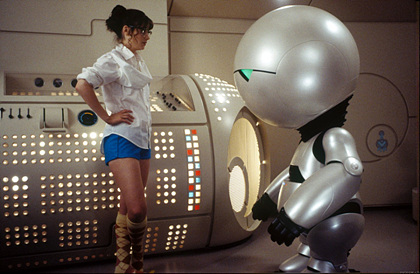
![[PIFF] 축제를 마치고 돌아오다 –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6)](http://0jin0.com/wp-content/uploads/1/48ef5c9a8a8bbAC.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