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세,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그때는 모든 것이 반짝였다네

그때는 모든 것이 반짝였다네

얼마 전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는데 <쿨 러닝 Cool Runnings>이란 영화가 막 시작했다. 이미 몇 번 봤지만 워낙 좋아하는 영화라 한 번 더 소파에 엉덩이를 붙이기로 했다. <쿨 러닝>은 서울올림픽 100m 달리기 부문에 출전하려던 자메이카의 ‘데리스’란 육상선수가, 대표 선수 선발전에서 동료 선수가 넘어지는 바람에 어이없이 탈락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낙담하고 있던 데리스가 우연히 단거리 선수가 동계올림픽의 봅슬레이 종목에 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상 유래없던 ‘자메이카 봅슬레이 팀’을 구성, 같은 해 겨울 캘거리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며 벌어지는 좌충우돌이 영화의 주된 내용이다.
*
영화 도입부의 배경이 된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일. 인생에서 올림픽 개막식 중계방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원짜리 아이스크림보다 적었던 초등학교 4학년이던 나는 “개막식 안 보고 어디 가니” 란 어머니의 말씀을 뒤로 하고 친구들과 이태원으로 향했다. 이슬람 성원 앞뜰에서 고무줄놀이를 하기 위해서였다. 어릴 적 서울 한남동에 살았던 나는 그렇게 종종 인근 이태원에 자리한 이슬람 성원에 놀러 가곤 했다. 종교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던 때였지만, 이슬람 성원의 분위기는 인근 교회 놀이터와는 오묘하게 달랐다. 어린 마음에도 어쩐지 엄숙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경외감보다는 놀고싶은 마음이 더욱 컸기 때문에 나와 친구들은 어느새 슬금슬금 고무줄놀이를 하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 외치며 키득거리곤 했다. 검은 피부의 이슬람 신도들은 그곳이 그들에게 무척 성스러운 곳이었을 텐데도 까부는 우리 옆을 말없이 지나치곤 했다. 나는 어쩐지 그들이 마음에 들었다.
이태원과 한남동엔 온갖 인종이 뒤섞여 살고 있었다. 다른 동네에 사는 친척 동생들이 우리집에 놀러와 거리에 돌아다니는 외국인들을 보고 깜짝 놀라는 모습이 더 신기할 정도였다. 부모님은 가끔 이런 대화를 하셨다. “공사 중인 옆집엔 미국인들이 들어온다네. 그런데 지금 달아 놓은 대문 말이야. 그게 한 짝에 삼백만 원 짜리라데.”
그러면 나는 이렇게 끼어들었다.
“왜 그렇게 비싼데요?”
“주석으로 만든 대문이거든. 그게 비싼 재료라 그렇지. 저 사람들은 돈이 많아. 하지만 집은 저 사람들 것이 아니야. 세를 들어 살지.”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집을 안 사요?”
“외국인은 우리나라 땅을 살 수가 없거든. 법이 그래.”
부모님과 대화하며 참 이상한 법이라고 대꾸하면서도, 나는 삼백만 원 짜리 대문을 달 수 있는 이들 수십 명이 모이면 우리 나라를 통째로 사 버릴 수도 있어서 그런 것이려니 짐작했다. 그리고 언젠가 아침에 눈을 뜨면 밤사이 누가 대문을 훔쳐 갔다고 법석을 떠는 미국인 가족을 구경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결국 동네를 떠날 때까지 그런 광경은 보지 못했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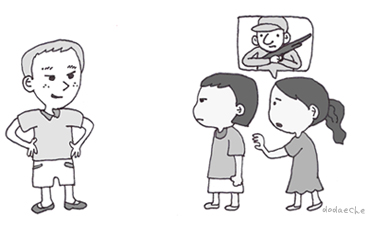
담벼락에 단 대문의 가격 차이만큼 거리가 느껴졌던 미국인들. 뒷집에 살던 내 또래 백인 아이들은 가든 파티할 때마다 왁자지껄 떠들었고, 고기 냄새와 함께 우리 집 담 너머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리고 동네의 또 다른 백인 아이들은 골목에서 마주치면 못 알아듣는 영어로 소리를 질러댔다. 그게 욕이라는 건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그 아이들이 괘씸해 눈을 부라리며 다가서면, 지나가던 모르는 아이들까지 말리곤 했다.
“쟤네들 잘못 건드리면 미군들이 총 들고 달려온대.”
이런 말을 들으면 별 수 없이 분을 삭이며 돌아서야 했다. 너무 어려 몇 살이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도 않는 언젠가 나는 주한미군 부대 부근을 지나고 있었다. 골목대장을 도맡던 ‘선민’이란 남자아이의 지휘 아래 꼬맹이 네다섯 명이 일행이었다. 일제히 수풀을 헤치며 포복자세로 기어가던 우리는 “여기부턴 미군 부대야. 걸리면 모두 총에 맞으니까 조심해”라는 선민이의 말에 얼마나 숨을 죽였던지. 미군의 눈에 띄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벌벌 떨며 기어다녔던 그때는, 내가 기억하는 한 죽는 것이 최초로 두려웠던 순간이다.
학교 근처에서 ‘뽑기’와 쥐포를 팔며 아이들에게 트램플린(넓은 천 가장자리에 용수철을 달아 고정하여 뛰어노는 놀이기구. 일명 ‘덤블링’, ‘방방’)을 태워주던 아줌마는, 줄 선 아이들이 많을 때는 한 사람이 십 분 이상 못 타게 했지만 백인 아이들이 삼십 분을 타는 것은 내버려 두셨다. 항의하면 아줌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쟤네 말리면… 말도 마라. 저번엔 떼로 몰려와서 두들기고 난리였다.”
아이들은 거들었다.
“그래. 그러다 미군들이 오면 어떡해.”
그러면서 매년 할로윈데이가 오면, 아이들은 외국인 아파트를 돌며 사탕을 받아왔다. 동네 가게에서 파는 스카치캔디나 자두맛사탕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희한하고 맛있는 사탕들. 나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나눠 주는 그 사탕을 한두 개씩 받아먹긴 하면서도, 내 손으로 직접 사탕을 달라고 손 내미는 짓은 죽어도 안 해, 다짐했다.
살고 있는 인종만큼이나 인간 유형도 다양했다. 저녁 무렵 엄마 손을 잡고 동네 미용실에 가면 다 큰 여자들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옷을 훌렁훌렁 벗고 있었다.
“엄마, 저 언니들 여기서 빨가벗는다.”
“언니가 아니라 남자들이야.”
그들은 이태원 어느 가게의 쇼에 나갈 준비를 하는 트랜스젠더들이었다.
한옥형인 우리집 별채에 세 들어 살던 아줌마는 진한 화장에 미스코리아 파마를 하고 있었다. 엄마는 그 아줌마가 양색시라고 했다. 미군의 색시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불행히도 술과 담배를 너무 많이 해 몸을 버려 아기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나는 아줌마가 휴지통에 버린 작은 가위를 학교에 들고 가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가위를 가져왔다”라고 자랑하기도 했다. 몇 년이 더 지나서야 그게 손톱을 다듬는 가위라는 것을 알았다. 아줌마는 나중에 미군이 아줌마를 버리고 한국을 떠난 후 일본인의 처가 되어 일본으로 날아가 엄마에게 안부를 묻는 엽서를 몇 번 보내왔다.
내가 중학생이 되어 우리 가족은 이사를 하며 한남동을 떠났다. 그리고 나는 막연한 호감을 가졌던 아랍인들의 말 대신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사를 갔지만 전학을 하지는 않았기에, 수업이 일찍 끝나는 토요일이면 학교에서 출발해 한남동과 이태원을 거치는 버스 코스를 걸어 집으로 오곤 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쏟아지는 햇살 때문에 이태원의 모든 것이 반짝거렸다. 무성한 플라타너스 가로수 잎도, 오래된 상점 간판도, 노점상의 물건들도, 사람들의 머리카락도…. 나는 그 광경이 무척 마음에 들어, 마침내 이태원을 벗어나 삼각지 국방부 앞 너른 길을 지날 때면 들뜬 감정이 최고조에 달해 노래를 흥얼거렸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이란 노래는 어쩜 이렇게 이 상황과 잘 어울리는 걸까 감탄하면서.
*
영화 도입부의 배경이 된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일. 인생에서 올림픽 개막식 중계방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원짜리 아이스크림보다 적었던 초등학교 4학년이던 나는 “개막식 안 보고 어디 가니” 란 어머니의 말씀을 뒤로 하고 친구들과 이태원으로 향했다. 이슬람 성원 앞뜰에서 고무줄놀이를 하기 위해서였다. 어릴 적 서울 한남동에 살았던 나는 그렇게 종종 인근 이태원에 자리한 이슬람 성원에 놀러 가곤 했다. 종교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던 때였지만, 이슬람 성원의 분위기는 인근 교회 놀이터와는 오묘하게 달랐다. 어린 마음에도 어쩐지 엄숙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경외감보다는 놀고싶은 마음이 더욱 컸기 때문에 나와 친구들은 어느새 슬금슬금 고무줄놀이를 하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 외치며 키득거리곤 했다. 검은 피부의 이슬람 신도들은 그곳이 그들에게 무척 성스러운 곳이었을 텐데도 까부는 우리 옆을 말없이 지나치곤 했다. 나는 어쩐지 그들이 마음에 들었다.
이태원과 한남동엔 온갖 인종이 뒤섞여 살고 있었다. 다른 동네에 사는 친척 동생들이 우리집에 놀러와 거리에 돌아다니는 외국인들을 보고 깜짝 놀라는 모습이 더 신기할 정도였다. 부모님은 가끔 이런 대화를 하셨다. “공사 중인 옆집엔 미국인들이 들어온다네. 그런데 지금 달아 놓은 대문 말이야. 그게 한 짝에 삼백만 원 짜리라데.”
그러면 나는 이렇게 끼어들었다.
“왜 그렇게 비싼데요?”
“주석으로 만든 대문이거든. 그게 비싼 재료라 그렇지. 저 사람들은 돈이 많아. 하지만 집은 저 사람들 것이 아니야. 세를 들어 살지.”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집을 안 사요?”
“외국인은 우리나라 땅을 살 수가 없거든. 법이 그래.”
부모님과 대화하며 참 이상한 법이라고 대꾸하면서도, 나는 삼백만 원 짜리 대문을 달 수 있는 이들 수십 명이 모이면 우리 나라를 통째로 사 버릴 수도 있어서 그런 것이려니 짐작했다. 그리고 언젠가 아침에 눈을 뜨면 밤사이 누가 대문을 훔쳐 갔다고 법석을 떠는 미국인 가족을 구경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결국 동네를 떠날 때까지 그런 광경은 보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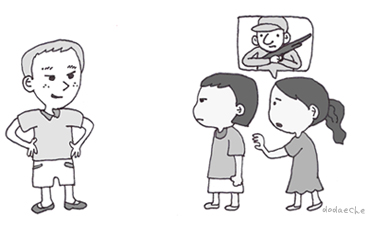
담벼락에 단 대문의 가격 차이만큼 거리가 느껴졌던 미국인들. 뒷집에 살던 내 또래 백인 아이들은 가든 파티할 때마다 왁자지껄 떠들었고, 고기 냄새와 함께 우리 집 담 너머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리고 동네의 또 다른 백인 아이들은 골목에서 마주치면 못 알아듣는 영어로 소리를 질러댔다. 그게 욕이라는 건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그 아이들이 괘씸해 눈을 부라리며 다가서면, 지나가던 모르는 아이들까지 말리곤 했다.
“쟤네들 잘못 건드리면 미군들이 총 들고 달려온대.”
이런 말을 들으면 별 수 없이 분을 삭이며 돌아서야 했다. 너무 어려 몇 살이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도 않는 언젠가 나는 주한미군 부대 부근을 지나고 있었다. 골목대장을 도맡던 ‘선민’이란 남자아이의 지휘 아래 꼬맹이 네다섯 명이 일행이었다. 일제히 수풀을 헤치며 포복자세로 기어가던 우리는 “여기부턴 미군 부대야. 걸리면 모두 총에 맞으니까 조심해”라는 선민이의 말에 얼마나 숨을 죽였던지. 미군의 눈에 띄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벌벌 떨며 기어다녔던 그때는, 내가 기억하는 한 죽는 것이 최초로 두려웠던 순간이다.
학교 근처에서 ‘뽑기’와 쥐포를 팔며 아이들에게 트램플린(넓은 천 가장자리에 용수철을 달아 고정하여 뛰어노는 놀이기구. 일명 ‘덤블링’, ‘방방’)을 태워주던 아줌마는, 줄 선 아이들이 많을 때는 한 사람이 십 분 이상 못 타게 했지만 백인 아이들이 삼십 분을 타는 것은 내버려 두셨다. 항의하면 아줌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쟤네 말리면… 말도 마라. 저번엔 떼로 몰려와서 두들기고 난리였다.”
아이들은 거들었다.
“그래. 그러다 미군들이 오면 어떡해.”
그러면서 매년 할로윈데이가 오면, 아이들은 외국인 아파트를 돌며 사탕을 받아왔다. 동네 가게에서 파는 스카치캔디나 자두맛사탕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희한하고 맛있는 사탕들. 나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나눠 주는 그 사탕을 한두 개씩 받아먹긴 하면서도, 내 손으로 직접 사탕을 달라고 손 내미는 짓은 죽어도 안 해, 다짐했다.
살고 있는 인종만큼이나 인간 유형도 다양했다. 저녁 무렵 엄마 손을 잡고 동네 미용실에 가면 다 큰 여자들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옷을 훌렁훌렁 벗고 있었다.
“엄마, 저 언니들 여기서 빨가벗는다.”
“언니가 아니라 남자들이야.”
그들은 이태원 어느 가게의 쇼에 나갈 준비를 하는 트랜스젠더들이었다.
한옥형인 우리집 별채에 세 들어 살던 아줌마는 진한 화장에 미스코리아 파마를 하고 있었다. 엄마는 그 아줌마가 양색시라고 했다. 미군의 색시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불행히도 술과 담배를 너무 많이 해 몸을 버려 아기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나는 아줌마가 휴지통에 버린 작은 가위를 학교에 들고 가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가위를 가져왔다”라고 자랑하기도 했다. 몇 년이 더 지나서야 그게 손톱을 다듬는 가위라는 것을 알았다. 아줌마는 나중에 미군이 아줌마를 버리고 한국을 떠난 후 일본인의 처가 되어 일본으로 날아가 엄마에게 안부를 묻는 엽서를 몇 번 보내왔다.
*
내가 중학생이 되어 우리 가족은 이사를 하며 한남동을 떠났다. 그리고 나는 막연한 호감을 가졌던 아랍인들의 말 대신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사를 갔지만 전학을 하지는 않았기에, 수업이 일찍 끝나는 토요일이면 학교에서 출발해 한남동과 이태원을 거치는 버스 코스를 걸어 집으로 오곤 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쏟아지는 햇살 때문에 이태원의 모든 것이 반짝거렸다. 무성한 플라타너스 가로수 잎도, 오래된 상점 간판도, 노점상의 물건들도, 사람들의 머리카락도…. 나는 그 광경이 무척 마음에 들어, 마침내 이태원을 벗어나 삼각지 국방부 앞 너른 길을 지날 때면 들뜬 감정이 최고조에 달해 노래를 흥얼거렸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이란 노래는 어쩜 이렇게 이 상황과 잘 어울리는 걸까 감탄하면서.
라일락 꽃향기 맡으면
잊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살 가득 눈부신 슬픔 안고
버스 창가에 기대 우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찬비 흩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여위어가는 가로수
그늘 밑 그 향기 더하는데
아름다운 세상
너는 알았지
내가 사랑한 모습
저 별이 지는 가로수
하늘 밑 그 향기 더하는데
내가 사랑한 그대는 아나
잊을 수 없는 기억에
햇살 가득 눈부신 슬픔 안고
버스 창가에 기대 우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떠가는 듯 그대 모습
어느 찬비 흩날린 가을 오면
아침 찬바람에 지우지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잊지 않으리 내가 사랑한 얘기
여위어가는 가로수
그늘 밑 그 향기 더하는데
아름다운 세상
너는 알았지
내가 사랑한 모습
저 별이 지는 가로수
하늘 밑 그 향기 더하는데
내가 사랑한 그대는 아나
* 월간 <논> 2006년 10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작곡가 故 이영훈님의 명복을 빕니다.
작곡가 故 이영훈님의 명복을 빕니다.
영진공 도대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