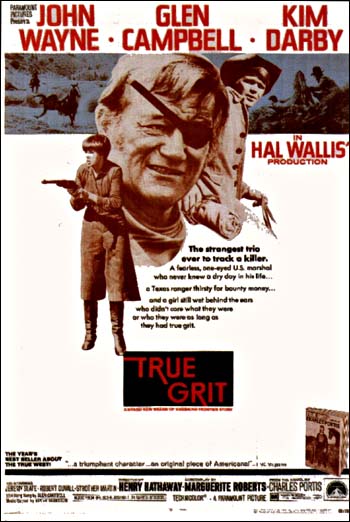어떤 소재의 영화를 만들더라도 코엔 형제가 만들면 걸작이 되고 그들 특유의 내음이 난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돌이켜 보면 코엔 형제의 영화들 중에서도 범작은 있었다. 하지만 <시리어스 맨>은 분명 잘 만들어진 축에 속하는 작품이다.
<시리어스 맨>은 67년 미네아폴리스의 유태인 커뮤니티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다. 코엔 형제 자신들의 어린 시절 추억담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이들도 분명 히브리어 학교를 다니고 유대식 성인 예식을 치렀으리라.

코엔 형제의 작품들이 종종 삶과 종교에 관한 메타포를 암시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작품 전체의 메인 테마로 삼았던 적은 <시리어스 맨>이 처음이라 생각된다.
주인공 래리(마이클 스터버그)는 굳이 비교하자면 구약의 욥과 같은 인물이다. 자신에게 닥쳐오는 안좋은 일들 – 아주 어처구니 없기까지 하다 – 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신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 랍비들과 상담하지만 결국 답을 얻지는 못한다.
특히 영화의 결말은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불가역성을 강조한다.
궁지에 몰린 래리는 마침내 한국인 학생의 ‘미스테리한’ 뇌물을 받아들이는데,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는 바로 그 순간에 무시무시한 전화를 받는다. 래리의 아들 대니는 압수 당했던 트랜지스터 라디오와 20달러 지폐를 되찾아 더이상 친구를 피해 달아날 필요가 없어졌지만 그 보다 더 무서운 토네이도가 다가온다. 집 안으로 잽싸게 피해 달아나는 식의 방법으로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영화 도입 부분에 삽입된 단편도 결국 불확실성에 관한 이야기다.
굳이 메시지를 뽑아내자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정도가 아닐까 싶다. 하지만 이건 코엔 형제의 영화를 보는 바른 자세가 아니다. 정리하려고 하지말고 그냥 보여주시는 대로 받아들일지어다.

유명한 스타 배우도 없고 코엔 형제 영화의 단골 출연 배우도 없다 – 물론 이것도 미국 영화니까 낯익은 배우 두어 명 정도는 나온다. 캐스팅의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건 간에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작품을 위해선 최상의 캐스팅이란 실은 바로 이런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 흥행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되었을테지만 낯선 배우들이 등장하는 영화는 종종 아주 사실적인 느낌으로 다가오곤 한다. 낯익은 배우들이 주는 기시감이나 고정된 이미지가 배제되기 때문에.
코엔 형제 영화의 출연진들은 대체로 매끈한 스타급 주연 배우와 함께 굉장히 재미있는 조연과 단역 배우들로 구성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시리어스 맨>은 스타급 배우가 없는 영화이니 만큼 출연진 전부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나칠 정도로 희화화된 인물은 없지만 다들 이런저런 장기를 발휘하며 한 웃음씩 전해주신다.

소품 성격의 작품이긴 하지만 그 대신 아주 밀도 높은 연출의 내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작품이다. 미장센과 음악의 사용도 훌륭하지만 특히 음향 효과의 사용이 유난히 특출나게 느껴진다.
다윗이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훔쳐보았듯이 래리가 이웃집 여인 샘스키 부인을 지붕 위에서 발견했을 때 샘스키 부인의 담배 태우는 소리가 거기까지 들려올 리가 만무하지만 영화 속에서는 이것으로 래리의 오감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 어쩌면 뜻밖의 목표물을 발견한 남성의 능력이란 실제로 초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인지도. 그래서 이번엔 음향 편집 담당자의 이름을 찾아봤다. 코엔 형제와는 초기작부터 줄곧 함께 작업해온 스킵 리브시(Skip Lievsay)다.
영화의 시작과 끝을 모두 제퍼슨 에어플레인의 Somebody To Love로 장식했다. 그러고 보니 샘스키 부인 역의 에이미 랜데커에게서 그레이스 슬릭의 느낌이 난다.

감독, 작가, 프로듀서인 코엔형제(Joel & Ethan Coen)
영진공 신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