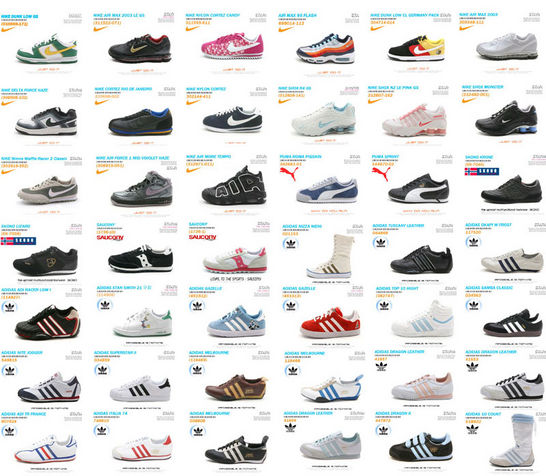“꿈이 뭐예요?”
“명문대 나와 월급 빵빵한 직장에 들어가야지”
“아니면 연예인이 되어 모두가 나만 쳐다보는 걸 즐기는 거야”
“그리고 벤츠차 굴리면서 강남에서 살아봐야하지 않겠어”
“… 그건 … 꿈이 아니잖아요 …”
명문대 졸업에 억대 연봉을 받는 임원이 되거나 잘 나가는 연예인이 되어 몇 억이 넘는 출연료를 받으며 강남에 큰 아파트 사고 마이바흐 굴리면 그 다음엔 … 또 뭘 사고 뭘 이뤄야하지?
그렇게 자꾸 욕심을 키워가는게, 그렇게 사는게 내 꿈이 될 수 있을까?
내 삶의 목표, 내 커다란 욕구가 될 수야 있겠지만 … 그걸 꿈이라고 할 수 있나?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나만을 위한 무언가를 원한다는 게 꿈이기나 한 걸까?
오늘 내가 왜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리고 내일 나는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게 내 꿈이어야하지 않을까 …
그런데 요즘 또 지금 내게는 꿈이 있는가?
그래서 꿈이 그립다.
꿈을 그리며 노래를 들어본다.
꿈이 그리운 사람과 함께 듣고싶다.
John Lennon과 Carole King의 노래를 …
Imagine
By John Lennon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천당이란게 없다고 상상해봐요,
그냥 생각해봐요,
땅 속에는 지옥도 없고,
머리 위에는 하늘만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보다 나은 오늘을 위해,
살아가는걸 상상해보세요
Imagine there’s no countries
It isn’t hard to do
Nothing to kill or die for
And no religion too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국가라는게 없다고 상상해봐요,
어려워말고 그냥 생각해봐요,
누굴 죽일 필요도 무엇을 위해 죽을 필요도 없죠,
종교도 없다고 상상해봐요,
우리 모두가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걸 상상해보세요,
You may say that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live as one
날 보고 몽상가라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난 혼자가 아니랍니다.
언젠가 그대도 함께 하길 바래요,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Imagine no possessions
I wonder if you can
No need for greed or hunger
A brotherhood of man
Imagine all the people
Sharing all the world
소유가 없다고 상상해봐요,
그러실 수 있나요?
탐욕도 없고 굶주림도 사라져,
형제애가 넘치는 세상,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함께 나누는 상상을 해보세요,
You may say that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live as one
날 보고 몽상가라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난 혼자가 아니랍니다.
언젠가 그대도 함께 하길 바래요,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You’ve Got A Friend
By Carole King
When you’re down and troubled
And you need some loving care
And nothing, nothing is going right
Close your eyes and think of me
And soon I will be there
To brighten up even your darkest night
네가 어렵고 힘들 때,
아무 것도 제대로 되는 게 없을 때,
사랑의 손길이 필요할때,
눈을 감고 나를 생각해,
그러면 나 거기 있을테니,
네 가장 어두운 밤을 밝히는 빛이 되려니,
You just call out my name
And you know wherever I am
I’ll come running to see you again
Winter, spring, summer or fall
All you have to do is call
And I’ll be there
You’ve got a friend
그냥 내 이름을 불러,
나 어디에 있든 대답할테니,
널 보기 위해 달려올 거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든 나를 부르기만 해,
그러면 나 거기 있을테니,
네겐 친구가 있다는 걸 기억해,
If the sky above you
Grows dark and full of clouds
And that old north wind begins to blow
Keep your head together
And call my name out loud
Soon you’ll hear me knocking at your door
네 머리 위의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을 때,
거친 북풍이 불어올 때,
고개를 들고,
내 이름을 크게 불러,
그러면 넌 곧 내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거야,
You just call out my name
And you know wherever I am
I’ll come running to see you
Winter, spring, summer or fall
All you have to do is call
And I’ll be there
You’ve got a friend
그냥 내 이름을 불러,
나 어디에 있든 대답할테니,
널 보기 위해 달려올 거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든 나를 부르기만 해,
그러면 나 거기 있을테니,
네겐 친구가 있다는 걸 기억해,
Ain’t it good to know that you’ve got a friend
When people can be so cold
They’ll hurt you, and desert you
And take your soul if you let them
Oh, but don’t you let them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지 않니?
네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나 냉정할 때,
그들이 널 상처내고, 널 황폐화 시킬때,
그들은 네 영혼마저 요구할지도 몰라,
하지만 친구여, 그들에게 영혼까지 내주지는 마,
You just call out my name
And you know wherever I am
I’ll come running to see you again
Winter, spring, summer or fall
All you have to do is call
And I’ll be there
You’ve got a friend
그냥 내 이름을 불러,
나 어디에 있든 대답할테니,
널 보기 위해 달려올 거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든 나를 부르기만 해,
그러면 나 거기 있을테니,
네겐 친구가 있다는 걸 기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