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간의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식객>에 나름의 기대를 했던 건 그게 허영만의 작품을 원작으로 했기 때문이다.
원작이 그렇게 훌륭하면 <검은 집>처럼 대충 만든다 해도 재미가 있고,
<타짜>는 원작에 버금가는 재미를 선사해주지 않았던가.
하지만 <식객>은 어떤 감독이 메가폰을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사실을 내게 가르쳐 준 영화에 그쳤다.

식객에서 아쉬운 부분은 하나 둘이 아니다.
첫째, 주인공인 김강우(성찬) 편인 정은표와 라이벌인 임원희(오사장)의 편에 선 김상호가 왜 군대 선후배 관계여야 하는가이다.
둘이 친해야 할 이유라곤 억지웃음을 유발하는 것 말고는 없었는데
설정 자체가 무리라 그런지 난 하나도 웃기지 않았다.
둘째, 오사장을 악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그려놨다.
요즘 트렌드는 악인과 선인의 경계가 모호한 게 특징인데,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없다해도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안가리는 오사장의 모습은 그냥 짜증스럽기만 했다.
게다가 악의 유전성까지 언급하는 것 같아 불편했는데,
이런 류의 선악구도는 좀 시대착오적이 아닐까 싶다.
셋째, 소를 잡은 대목.
좋은 소를 구해오라는 과제가 떨어졌을 때
성찬 주위의 사람들은 성찬이 기르는 소를 잡자고 하나
정은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타이른다.
“저건 소가 아니야… 성찬이 동생이야. 너 같으면 네 가족을 잡아먹고 싶겠니?”
하지만 성찬은 그 소를 잡음으로써 ‘동생론’을 편 정은표를 무안하게 한다.
성찬이 요리대회에 참여하는 계기는 오사장에 대한 경쟁심이 생겨서인데
내가 털 있는 동물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신의 사적 목적을 위해 동생처럼 여기는 소를 꼭 잡아야 했을까?
까짓것 최고의 요리사로 인정 못받으면 어떤가?
그 소와 함께 호형호제하며 사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
“너희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며 성찬이 울 때,
난 그게 악어의 눈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 밖에도 <식객>은 잘 만든 영화가 아님을 여러 곳에서 증명하는데,
소의 근출혈을 뒤늦게 발견해 극적 효과를 노리는 유치함도 그 하나다.
만화 <식객>을 딱 두권밖에 못봐서 모르겠지만
원작은 이렇게 이상하진 않았다.
내가 기억하는 원작은 성찬이란 청년이 전국을 돌면서 맛을 찾는 거였는데
여기선 그게 요리대회로 탈바꿈하고 만다.
요리가 기술임은 분명하지만
미각이 100미터 달리기처럼 등수를 매길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것도 사실 아닌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홍대앞 떡볶이를
다른 친구는 자기 동네가 더 맛있다고 우기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 대회에서 우승을 못한다고 해서 그 요리사가 실력이 없는 건 아닐텐데,
오사장이 종합 2위를 달린다고 해서 매출이 50%로 떨어진다는 발상도 지나치게 유치하다.
게다가 민족주의적인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도
요즘 트렌드로 봐서는 그리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다.
내가 <한반도>를 괜찮게 평가하는 건
그 영화가 애초부터 그런 의도로 기획되었고
내용 자체도 그럭저럭 공감할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낭만자객>에서 난데없이 나오는 민족주의의 발현에 난 뜨악했고
그 비슷한 느낌을 <식객>에서도 받는다.
아무리 잘줘봤자 10점 만점에 7점인 이 영화는
TV에서 추석특선 시리즈로 나올 때 보는 게 나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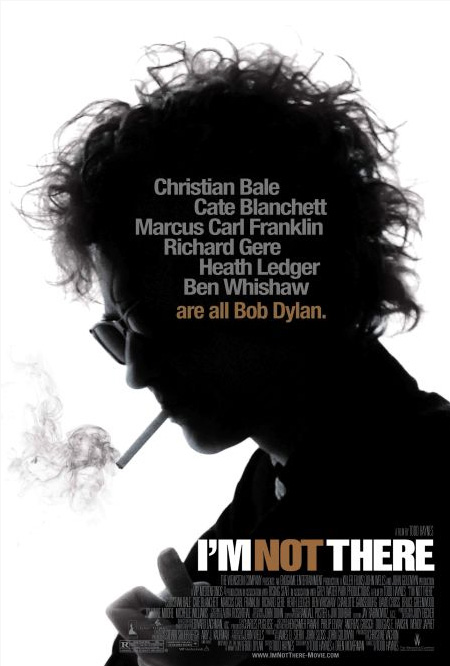
![[가사 검열] My One And Only Love](http://0jin0.com/wp-content/uploads/1/fk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