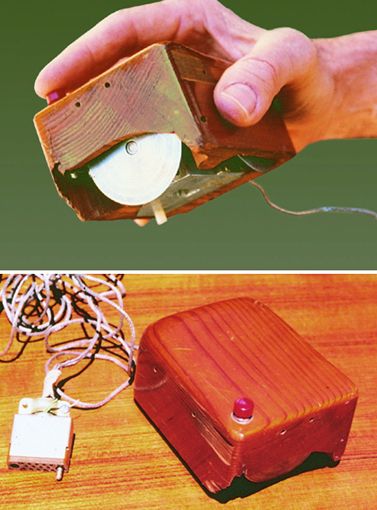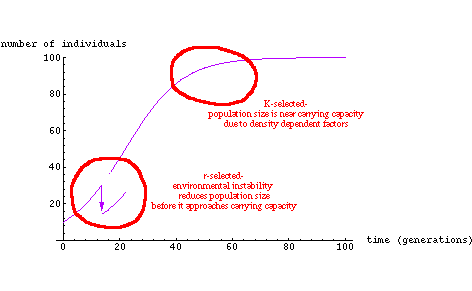수잔 보일(Susan Boyle)이 하도 집안에서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옆집 사람한테 고소를 당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기사 참고)
수잔 보일이 누구냐하면 수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 중에서,
엄청난 반전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인데,
지난 2009년 “Britain’s Got Talent”에 47세의 나이로 참가하여,
극성맞은 아줌마의 외모와는 다르게 놀라운 가창력으로 결승에 올라,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그 기세를 몰아 그녀는 세계 투어를 하기도 하였고, 발표한 앨범
“I Dreamed A Dream”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챠트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녀가 처음 오디션장에 들어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인기가 있는데 그걸 한 번 보도록 하자.
그녀가 오디션에서 부른 노래의 제목은 “I Dreamed A Dream”.
이 곡은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뮤지컬로 만든 “레미제라블 (Les Misérables)”에,
삽입되어있는 곡인데 극 중에서는 Fantine이 부르는 노래이다.
프랑스에서 조촐하게 만들어졌던 이 무대극을 영국의 제작자가 뮤지컬로 만들어 공개한 것이 1985년, 그리고 브로드웨이 무대에 올려진 건 1987년.
그 후로 이 뮤지컬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극 중의 하나로 손 꼽히며 브로드웨이에서 지금도 계속 공연 중에 있다.
우리에게는 쟝발잔과 신부의 에피소드 정도로 알려져있는 작품, “레미제라블”.
허나 실은 이 소설의 주인공은 제목 그대로 프랑스 혁명 시기 가난과 핍박에 허덕이던,
“비참한 인생들 (Les Misérables)”이다.
그러니까 극 중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Fantine처럼,
직장을 잃고 생계를 위해 매춘의 길로 들어서는 이들,
그녀의 딸 Cosette처럼 어릴때부터 학대와 착취에 시달리는 이들,
처참한 대우를 받으며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가던 공장노동자들,
그런 사회의 현실에 분노하여 혁명을 외치며 투쟁에 나서는,
Marius 같은 이들이 주인공인 것이다.
그런데 이 소설과 지금의 우리 현실이 구조적으로 뭐가 그리 다를까.
누리는 사회적 자원의 양이 늘고 정치 참여의 정도와 기회가 넓어졌지만,
근본적인 구조가 변하지는 않은 듯 하다.
요즘은 오히려 소위 선진국의 부자들과 고위정책담당자들이 지레 나서서,
호들갑스럽게 자본주의의 종말을 큰 소리로 외치고 다니는데,
과연 그들이 머리 속에 그리고있는 미래의 사회구조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의 심중과 우리의 꿈은 결국은 일치하게 될까.
I Dreamed A Dream
From the musical “Les Misérables”
There was a time when men were kind
When their voices were soft
And their words inviting
There was a time when love was blind
And the world was a song
And the song was exciting
There was a time
Then it all went wrong
사람들이 서로를 챙겨주던 때가 있었지,
그때는 모두가 다정한 목소리로,
서로를 이해하는 말들을 나누었어,
그때는 사랑에 조건이란 건 없었어,
세상은 온통 노래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노래는 모두 흥겹기만 했었지,
그런 때가 있었어,
그런데 그 모든 게 잘못돼 버렸어 ……
I dreamed a dream in time gone by
When hope was high
And life worth living
I dreamed that love would never die
I dreamed that God would be forgiving
Then I was young and unafraid
And dreams were made and used and wasted
There was no ransom to be paid
No song unsung, no wine untasted
그 꿈을 꾸었던게 언제였던가,
부푼 희망과,
삶의 의욕이 넘치던 그때,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으리라 꿈꾸었지,
신은 모든 걸 용서하시리라 꿈꾸었지,
하지만 그때 난 어리고 겁이 없었어,
그 꿈들은 옛일이 되었고 잊혀진채 버려졌다네,
그때에는 사람을 몸값으로 흥정하지 않았지,
그때에는 누구나 노래를 불렀고, 모두들 술을 나눠 마셨지,
But the tigers come at night
With their voices soft as thunder
As they tear your hope apart
As they turn your dream to shame
하지만 한밤 중에 그 호랑이들이 나타나고 말았지,
천둥처럼 낮고 음산한 울음을 그르렁대면서,
그 놈들은 나의 희망을 갈갈이 찢어놓았고,
그 놈들은 내가 꾸었던 꿈을 수치로 바꿔 놓았지,
He slept a summer by my side
He filled my days with endless wonder
He took my childhood in his stride
But he was gone when autumn came
그는 나와 함께 여름을 지냈다네,
그는 나의 나날들을 멈추지않는 경이로 채워주었지,
그는 내 어린시절을 그의 걸음으로 감싸주었지,
그러나 가을이 오자 그는 떠나버렸네,
And still I dream he’ll come to me
That we will live the years together
But there are dreams that cannot be
And there are storms we cannot weather
난 여전히 그가 내게 돌아오리라 꿈꾸고있네,
우리 오랜 세월을 함께 살거라 믿고있다네,
하지만 이뤄지지 않을 꿈이 있다는 걸 나는 아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다는 것도 아네,
I had a dream my life would be
So different from this hell I’m living
So different now from what it seemed
Now life has killed the dream I dreamed.
난 꿈꾸었다네,
지금의 지옥과는 전혀 다른 나의 삶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나의 삶을,
하지만 지금의 삶은 내가 꾸었던 꿈을,
죽여버렸다네,
영진공 이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