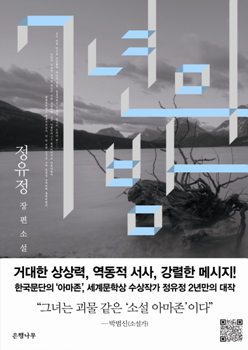2007년 개봉 영화 “나는 전설이다 (I am legend)”의 원작은 리처드 매드슨의 동명소설이다. 1954년작인 이 책은 (그냥 일반적인 기대만 갖는다면) 당연히 지루하고 식상하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익숙한 좀비상을 가지고 있고, 이 책은 그 모든 좀비 이미지의 원류이니까.
제인 오스틴의 소설들이 온갖 HR 공식에 익숙해진 현대 관객들에게 식상해 보이듯, 그러나 또다른 의미로 재발견되고 재해석되듯, [나는 전설이다]가 출판 당대에 좀비라는 새로운 존재 – 이물적 존재이면서도 모태는 인간인 – 의 매혹으로 어필하였지만, 현대독자인 나는 이 소설의 엔딩의 혁명성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
생존 그 자체를 위해 분투하는 존재임은 수가 얼마 남지 않은 인간이나 새로이 급증하고 있는 좀비나 마찬가지. 여기엔 선과 악이라는 윤리적 개념이 들어설 자리가 없으며, 생존투쟁의 승리만이 유일한 선이 된다. 인간과 좀비 간 전쟁에서 마침내 좀비가 사회를 구성하고 살 방법을 찾기 시작했을 때 최후의 인간 생존자는 죽어서 전설의 영역으로 입장해야 할 운명만이 남는다. 아마도 호모 사피엔스가 그런 방식으로 살아남았을진데, 호모 좀비쿠스 같은 이름을 가진 새로운 존재가 호모 사피엔스를 대체한다한들 ……

그러고 보면 수많은 호러영화들이 당연한 듯 인간의 승리로 막을 내렸던 것은 그 모든 좀비물의 조상인 이 소설에 대한 반역적인 퇴행, 혹은 퇴행적 반역인 건지도 모른다.
많은 인간들이 자본주의적 인간을 중세적 인간보다, 혹은 자본주의적 냉혈인간을 온정주의적/윤리적 인간보다 진화한 것으로 믿고 있는 세상에서, 평균수명을 늘린 대신 면역결핍과 신종질병에 시달리는 현대 인류가 과거 인류보다 진화한 것이라면, 좀비가 인간보다 ‘진화한’ 존재라고 말한들 과연 언어도단이 될까. 아니, 우리들 중 대부분은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새에 이미 좀비가 됐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인간 특유의 자기합리화 방식 아니었던가.)

[나는 전설이다]의 엔딩은, 가상역사에서의 미래이자, 우리의 과거이기도 하다. 제우스가 새로운 신의 계보를 시작하며 신중의 신의 자리로 등극한 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속한 타이탄 족을 멸망시킨 이후이다.
[나는 전설이다]의 주인공 네빌은 결국 또다른 크로노스(제우스의 아버지, 타이탄족)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운명을 수긍하는 그의 모습은, ‘마지막 인간’으로서 전설의 주인공이 될 존재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